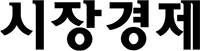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손님이 억수로 줄었지예. 4시만 되도 텅텅 빈다 아입니까.”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닥치기 시작했다. 화마가 서문시장 4지구를 한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상인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화재 이후 서문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열흘 새 월세도 훌쩍 올랐다. 터전을 잃은 4지구 상인들이 속속 시장에 자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시장은 이 기막힌 시련을 털고 다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11일 서울역에서 1시간 40분여를 달려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지하철로 20여분을 더 가 서문시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께. 시장 입구부터 탄내가 진동했다.
시장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상인들은 마스크와 목도리 등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일을 했다. 기자가 만난 상인들 상당수는 두통과 기침을 호소하고 있었다.
화재가 난 4지구 건물은 시장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검게 그을린 건물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곳곳에 ‘붕괴위험 접근금지’라고 적힌 경고문구가 을씨년스럽다. 펜스와 인근 상점들과의 거리는 채 2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오토바이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성순자(가명·52)씨의 한복가게는 그을린 4지구 건물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있다. 그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성 씨는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4지구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칼국수를 만들었다는 최금숙(60·가명)씨는 “(연말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야 정상”이라며 “연말과 신년이 대목인데 손님이 줄어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주말 오후임에도 빈 자리가 적지 않았다. 화재 이후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던 야시장도 ‘올 스톱’됐다. 한 상인은 “이 상황에서 누가 시장에 놀러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4지구는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상인들 사이에서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취재를 위해 사고 현장 출입을 요청하자 경비원들은 “허가증을 받아오라”고 말했다.
인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동행 하에 취재를 하자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화재 현장을 빙 둘러싸고 있는 철제 가림판에 알록달록한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대동사 H신지하상가. 통영 누비 제품, 민속공예품’, ‘4지구 여성시대 2지구 1층으로 이전했어요’. 피해 상인들이 점포 이전 소식을 단골손님에게 알리고자 붙여놓은 것이다.
한 상인은 기자에게 “장사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시장의 생리라는 것이다. 1~2개월의 공백만 생겨도 단골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장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익성(48·가명)씨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종이 두 장을 붙였다. 한 장 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김 씨는 서문시장에서 30년째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십년동안 점원으로 일해 모은 돈 500만원이 장사 밑천이었다. 가방과 잡화를 팔았다.
팔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팔았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다. 그에게 있어 서문시장은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전 재산 3억으로 4지구에 두 개 점포를 얻었다. “피와 땀이 밴 점포”라고 말하던 김 씨는 “불이 30년 세월을 훔쳐갔다”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2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도한 터라 이후 상황이 짐작된다고 했다. 빨리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김 씨는 “매달 20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지금 손해를 만회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65살까지 일하려면 한숨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보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2지구 화재 당시의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성금이 12억 정도 모였고 120여만 원씩 피해 상가에 돌아갔다”면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다시 얻은 점포 정리로 바쁘다고 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일터로 돌아갔다. 작별 인사를 위해 맞잡은 김 씨의 손은 거칠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김 씨와 같이 다시 장사 터를 구한 경우는 운이 좋은 축에 속한다. 전소된 상가는 679곳. 대다수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생계가 막막하다. 다시 장사를 재개한 곳은 전체 상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대구=김양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