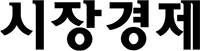20여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UN산하 모 위원회에서 ‘인권으로서의 신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던 일이 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보고서의 제목도 맞는지 모르겠고 위원회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UN산하기구였던 것은 분명했고 신용 즉, 빚을 내는 것도 인권(Human Right)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보고서를 접할 당시만 해도 ‘빚을 낼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니 말이 되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10여년 전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기구가 ‘채무자와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기자 또한 그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 채무자의 인권에 관해 한마디 했던 기억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은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었고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최고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는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현행 27.9%까지 인하돼 왔다.
유사 이래로 대금업자들은 항상 ‘악의 편’을 벗어나지 못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 그랬고 구두쇠 영감 스쿠루지도 고리대금업자였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만 보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정통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민생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대금업자들에 대한 박해(?)를 가했다.
박정희정권의 8·3사채동결조치와 전두환정권의 삼청교육대(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이들 절반이 대금업자), 노태우정권의 ‘범죄와의 전쟁’(대표적인 민생사범이 대금업자)이 그것들이다.
유사 이래로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던 법정 최고금리규제는 채무자에 대한 대금업자들의 착취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어설프게 포퓰리즘에 기반한 '서민부담 경감'이나 '민생안정' 따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신용이 인권인 세상이 돼 버렸다. 굳이 UN의 보고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리 높여 외쳐대던 이들이 신용을 전제로 하는 ‘휴대전화(통신권)도 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고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채무자들에 대한 대금업자들의 착취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는 규제돼야 마땅하다.
반면에 최고금리가 낮게 책정되면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외면하면 이 또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소화해 낼 수 없는 규제가 헌법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해고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헌법에 명시된 ‘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헌법가치의 훼손을 논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권’의 박탈에 대한 ‘헌법가치의 훼손’ 또한 논외의 대상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떼법’(포퓰리즘)과 떼법에 반하는 주장을 폈을 시 벌어질 보복(?)이 두려운 탓이다.
무솔리니와 히틀러 등 파시즘의 전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