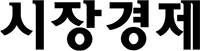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현장수첩] 지난 해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채권추심업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실에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자 대리인의 적용범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동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 및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에게만 채권과 관련한 통신 등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개별 연락 및 통신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써 미국에서는 금융업자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여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 2003년 ‘신용대란’이 터지면서 무지막지한 채권추심 때문에 자살까지 택해야 했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공론화됐다가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이듬해인 2008년 입법화되면서 제도가 도입됐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도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됐지만 미국의 제도에 비해 거의 유명무실했으나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확대되면 채무자들의 채무면탈이 심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의 심화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서민금융도 위축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신용사회의 근간마져 흔들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 회사들도 채권추심에 종사하고 있는 1만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엄살을 떨고 있다.
2004년 신용대란 이 후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됐다. 그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많게는 채무금액 전부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우려와는 반대로 연체율은 안정적이다. 우리보다 일찍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미국사회에서 보듯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일도 없고 서민금융이 위축될 일도 더더욱 없다. ‘미꾸라지와 메기’의 이론에서처럼 신용사회도 서민금융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개인 회생 제도가 입법화되면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업무로 인해 파생된 일자리는 2만개가 넘는다. 추심노동자들의 없어진 일자리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대도입에 금융권이 억지논리를 들이대며 엄살을 떠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의 모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만큼은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존재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대를 우려하는 금융권은 ‘을’에게 ‘대리인’이라고 하는 무기가 공급되면 ‘갑’과 평등한 위치에 서서 ‘맞짱(?)’을 뜨자고 덤비게 될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다.
‘빚진 죄인’ 이라는 속담이 표현하는 것처럼 채권추심 시장에서 채무자의 위치는 ‘수퍼 을’ 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겠는가?
‘을’에게 목숨 내던지지 말라고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본질이다. 기자는 우리 사회가 목숨을 내던질만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간단한 조력자 하나쯤 붙여주는 것에 대해 인색할 정도로 메말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