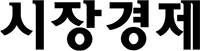조병돈 / 이천 시장
요즘 갑을론(甲乙論)이 화두다. 특히 갑 세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상천외한 ‘갑’의 돌출 행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만든다. 그들의 이런 행태가 지금은 이렇게 여론의 무거운 뭇매를 맞고 있지만, 갑의 횡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이고 우울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 이런 빗나간 행동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많다. 승자가 많은 것을 독식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일등 문화도 그 중 하나다. 물론 공정한 룰(Rule)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큰 상(賞)과 더 큰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엔 승자가 꼭 지켜야 할 가치들이 많다. 먼저 그들은 사회에 대해 좀 더 헌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또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도량도 필요하다. 특히, 주변에 대해 깊은 배려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그럼 이런 소중한 여러 가치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실천해야 옳을까. 당연히 아니다. 나 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갑의 선행보다 더 더욱 값지고,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대형마트는 골목가게, 전통시장과 상생해야 한다. 이게 배려의 출발이고,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다. 필자는 전자는 물론이고 후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필자는 이런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다. 온누리상품권이 시장(市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전통시장과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시작됐고, 통용장소가 한정돼 있다.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의 품목도 제한적 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함이 없지 않다. 자칫하다간, 용두사미 되기 십상이다.
이런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인 보호는 단체장의 중요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골목 상권을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최말단까지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생명유지가 어렵다.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다. 골목 상권의 침체와 쇠락은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다. 그 만큼 지역경제에서 골목 상권의 활력은 중요하고 절실하다.
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구입과 사용을 배려와 따뜻한 나눔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혹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놓고 불평한다. 다른 이는 전통시장의 영세성과 쇼핑의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면 맞다. 생각에 따라서 전통시장 등은 대형마트에 비해 쇼핑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젊은 소비층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선 쇼핑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다. 큰 덤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토산품이 있고, 상품가격을 놓고 협상의 전략도 익힐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매출액으로 돌아간다. 올 한해는 나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뜻 깊은 계획을 세우보고 실천해 보자. 그리고 그 계획표 한 구석에 온누리상품권을 꼭 구입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써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