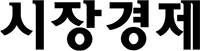지인 기업 끼워넣기, 납품사 교체요구 등 '갑질'
사업자 선정 후에도 무리한 설계 변경 등 요구
거부땐 조합원 투표로 언제든 사업권 박탈 가능
사업 지연 불보듯... 시공사·입주자 무슨 죄?

국내 건설사는 '갑(甲)'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갑·을·병 중 ‘병(丙)’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흔하다. 발주처가 조합이다 보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조합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설계요구를 떠안거나 심지어 시공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합장과 이사회는 길게는 10년 동안 수천억원이 걸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철거부터 설계, 납품, 협력업체 선정 등 모든 사업을 주도한다. 지인 업체를 소개하거나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시공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건설사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수천억원이 걸린 사업이 조합원의 손에 달려 있다 보니 입찰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사업을 수주한 후에도 마음을 놓긴 이르다. 협력업체 선정이나 브랜드, 설계 변경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시공권을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시공권 해지 관련 법령이 없어 조합은 입찰에 준하는 참석율과 찬성율만 지키면 언제든 시공사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 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적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시공권 박탈을 막거나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시공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민법상 배상을 받고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어렵게 따낸 사업권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과 가까울수록 두드러진다. 사업성을 이유로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지방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은 시공을 대신할 건설사가 줄을 서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조합이 마음 먹고 시공권을 박탈한다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며 "어렵게 따낸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 손실을 보상 받을 방안도 마땅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주 소식만으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해 상장사 주주들도 도시정비사업 수주 여부에 깊은 관심을 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이 반복되면 사업 연기는 물론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피해는 수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린 조합 뿐만 아니라 시공사, 예비 수요자, 주주가 모두 짊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