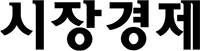채무자가 부채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떼먹던가 아니면 갚던가’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떼먹던가 아니면 매입하던가’로 변화했다.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채권을 돈을 주고 채권자에게서 매입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행위를 일컬어 통상 ‘채무변제를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채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정책 중 유독 눈에 거슬르는 것은 장기 연체 채권의 소각(탕감)정책이다.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의 시효연장을 통해 죽을 때 까지 채무노예로 만드는 부당함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탈락한 채무자들을 시장에 참여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난다. 왜 그런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가이며 부실채권은 왜 10년이상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세금까지 투입된다고 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앞서 부채의 공적화를 이루게 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개인들의 부채때문에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면 개인들의 부채를 소멸시키면 된다. 시장에서 부채를 없애는 방법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채무자가 빚을 떼먹거나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부실해진 채권이 시장에서 소멸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운용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채무자에게는 시장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된 가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권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공급자 위주로만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수직으로 서 있는 운동장인 셈이다.
물론 사적자치의 원칙 때문에라도 채무의 변제는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채무는 부실채권이 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가격을 요구하면 휴지조각이 돼 버린다.
부실채권을 빠르게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협상권을 강화해주고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굳이 세금까지 투입해가며 부채문제를 공적화시킬 필요도 없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채무자들의 협상권을 강화시켜 채무자가 부실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었다.
그 결과 채권의 ‘임의조정(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을 통해 부실채권시장에 존재하던 채권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쓸데없이 세금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니 가계부채가 내수침체의 원인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임의조정’은 부실채권시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1만여개나 만들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부채탕감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서민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해 보인다.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도 임의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뇌리속에는 늘상 ‘다음선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채무노예들은 선거때마다 ‘부채탕감’을 외치는 자신들의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