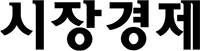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자들의 채무 부담 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채권추심 제도의 개선 등이 담긴 신용불량자 4대 공약을 발표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 중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계층은 780만 명 선이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났고 가계부채는 그 당시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금융소외계층은 300만 명이 줄어 든 480만 명(2016년 12월 기준 나이스 신용정보) 수준이다.
신용평가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전체 신용등급이 10년 전보다 평균 약 1.2등급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신용등급이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돈을 잘 갚을 수 있는가를 평가한 등급으로 소비자의 대출상환능력을 말한다.
두 배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서민들만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대출상환능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유인을 찾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체 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융 소외자 지원정책 덕분(?)에 국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것은 물론 아닐뿐더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월등하게 향상시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인 신용등급 평가관행의 개선을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주요 골자는 소비자들의 신용등급 상승이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보면 매번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용 평가시 가점 부여’, ‘신용등급 개선’ 등의 단어들이다.
물론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약한 기자의 발칙한 상상력(?)은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의 폭증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숫자놀음인 까닭에 정부가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환능력이 양호하다는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막아내고 차기 정권에게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의심한다.
신용평가 회사의 관계자들도 더러 기자와 비슷한 불만을 토로한다. 빚이 늘어났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꼭 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감안해보면 현 상황이 2007년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상환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등급을 올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늪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그 늪 속으로 떠 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폭탄 돌리기가 있다는 불만이다.
심지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이다.
물론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몫이다.
2004년 벌어졌던 신용대란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작금의 현황을 보고 있자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가지고 정권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또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폭탄의 심지가 길어 차차기 정권으로 넘길 수 도 있고 심지가 짧다면 다른 심지를 덧대서 심지를 길게 늘려놓고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자의 눈에는 이젠 덧 댈 수 있는 심지마저도 바닥이 보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