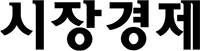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한국을 ‘가장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가진 국가 5위’로 평가했다.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7위)과 미국(8위) 보다 위다. 순위로만 보자면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환경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은 겉만 화려하다고 지적한다. 일선의 스타트업 대표들도 사업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객관적 수치로 보자면 한국은 창업을 하고 5년 안에 망하는 기업이 90%에 달한다. 10번 창업에 도전해야 1번 성공할 기회를 가지는 꼴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보다 정말 우월할까. 아니면 세계은행의 평가가 잘못된 걸까.
세계은행이 평가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창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 ‘쉬운 환경’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쉬운 환경에는 ‘주식회사’라는 터줏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주식회사’ 때문이다”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연 시작과 함께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달 31일 ‘스타트업 트랙: 법률·특허’라는 주제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김봉진 의장)에서 “1년에 10만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 이중 9만개가 5년 안에 망한다”며 “‘주식회사’는 스타트업에게 ‘쉽게 입은 무거운 옷’과 같아 상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말한 ‘쉽게 입은 무거운 옷’이라함은 창업은 쉬운데, 운영은 힘들다는 의미다. 영세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회사법이 상법과 분리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었던 일본 역시 12년 전인 2005년에 법을 개정해 단행화 시켰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에 ‘유한책임회사’ 등 5개의 회사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스타트업 보다 벤처‧캐피탈회사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질됐다”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창업자에 몰리던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재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식회사’가 줄고 ‘유한책임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교수는 단행화를 할 수 없다면 선진국 시스템으로 ‘주식회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식회사를 개혁하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로 구분 지었다. 감독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경영 이사회 또는 경영진을 감시도 한다.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권한과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점차 유럽의 이중 이사회 구조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나스닥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반영돼 주주권익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창업할 때 ‘유한책임회사’로 시작하고, 향후 기업공개(IPO) 등 적극적인 자본 활동을 취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시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창업 지원 정책과 금융 정책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창업 정책은 ‘주식회사’만 지원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본인 기업에 어울리지도 않는 ‘주식회사’를 입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여기에 주식회사 설립 과정은 원스톱으로 간편하다.
결국, 창업자는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 경영 형태로 기업을 이끌고 가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가 창업자들에게 크나큰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유한책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가면 현실은 딴 판이다. 은행 등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상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이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에 연대해 보증하는 대표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를 의미한다. 개인의 보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행책임을 지니게 되는 구조다. 포괄적 연대보증을 할 경우 개인이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은 유한책임성도 준용되지 않고, 주식회사를 ‘물적회사’로 간주하지도 않고 있다. 그냥 ‘인적회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너무 무거운 족쇄이고, 창업자나 대주주가 기업을 사유화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며 “상법에서 회사법만 분리해 단행화 하면 주식회사를 획일적으로 선택하는 창업 사례는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