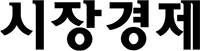서울시는 최근 대형마트 판매 조정가능 품목으로 담배-두부 등 51개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이후 각 언론들이 쏟아낸 제목들을 보자.
[잇따른 규제폭탄] [두 번 우는 마트 납품업체] [우린 죽으라고?] [해물찜 재료 사는 데 2시간 반] 등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많은 반면, [인천도 판매품목 제한을] [대형마트 판매 제한 환영] 등 지지를 표시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
품목 제한, 그것도 51개나 품목을 제한하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51개 품목 대부분은 채소와 신선 조리식품 등 먹거리이고,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울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판매 제한이 휴일 및 야간 영업 규제보다 더 강력한 전통시장 보호대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농수산물을 팔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자연히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측은 “양파, 배추, 두부, 오징어, 고등어까지 팔지 말라는 건 아예 장사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대형유통업체 판매 제한 품목이 강제성 있는 조치가 아닌 만큼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법률 개정 건의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선·가공식품을 대형마트에서 사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방문이 줄어 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품목도 함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납품하는 농민과 중소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한 발을 뺐다.
그러나 4월 초 공청회를 연 뒤 국회에 건의해 관련법 개정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물론 경제민주화 화두와 맞닿아 있는 서울시의 [골목상권 살리기] 의도는 대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거스르는 방법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유통의 자유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독과점이 장기화되면서 가격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거리 제한, 심야 영업 제한 등 기존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이중 규제]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 원칙에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가 크게 개입할수록 모두가 평등하게 잘살 수 있다고 믿는 사회주의적 국유화 발상과 다름없다.
시장은 시장대로 문화 공동체로 거듭나고, 마트는 마트대로 신상품과 대량 구매 등에 유리한 유통 경쟁력을 갖춰야 공존이 가능하다.
어차피 시장이 마트를 가격이나 상품 다양성 등으로 이기긴 어렵다.
시대는 늘 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후진적인 발상이다.
규제를 더하기 보다는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시켜주고 마을 공동체로 변신하도록 지원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더 현명하다.
규제 위의 규제를 내세우는 [네거티브 정책]은 몇 년도 못가서 지원에 길들여진 시장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이다.